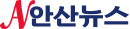조부님이 젊은 시절 한때 주력했던 사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앞장굴(前場浦)이라는 포구에서 당신 형님과 함께 중선(重船) 사업을 한 것이고, 사정이 되는대로 인근 낮은 야산을 개간하여 전답을 넓힌 것이 또 하나였다.
중선이라 함은 요즘으로 치면 ‘해양수산업’ 정도를 말하는데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초반에는 번창했으나 나중에는 농사일과 병행할 수 없어 접었다고(전해들었다) 한다. 솜씨도 없이 버는 일에만 치중했지 자식들을 도회지로 보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이재의 필살기를 개발하지도 전수하지도 못했다.
훗날 백부님이 유지를 받들어 배도 탔고 염전(鹽田)에도 손을 댔지만 평생 ‘먹고 한량’으로 일관하다 가셨고 다른 숙부들도 이곳저곳에서 이것저것 했으나 영역을 크게 넓히지는 못했다.
나는 전답을 팔아 한양이 됐든지 서울이 됐든지 다시 올라 와서 강남에 땅을 사거나 아니면 자식들을 일본 대판에 보내거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다.
지금도 명절 귀성길에 자동차가 밀릴 경우 한숨 쉬면서 투덜거린다. 기왕에 한양에서 탈출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가까운 제물포에나 머무르지 뭔놈의 로또를 잡을 거라고 낙도까지 오셨나. 설령 오실라면 최소 영광법성포에라도 머물렀어야지 임자도라는 섬까지는 또 왜 들어오셨나 하며 조상님들을 있는대로 원망하곤 한다. ‘안되면 조상 탓’하기 일도 아니다.
아무튼 그런 별 볼일 없는 집이 우리집이었는데 말하다 보니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다. 앞의 ‘주택비사’를 쓰려면 남겨놓은 이야기 찾아 다시 올라가 이어야 한다. 시작한다. 부엌 정지를 지나 모퉁이로 돌아가면 방이 둬 칸 더 있었는데 그곳에는 머슴 부부가 살고 있었다.
모친은 이 집을 방에서 정지로, 정지에서 마당으로, 다시 남새밭에서 텃밭으로 오가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신 것이다. 당신 발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당신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런 집이었는데 지금은 헐리고 아담한 새집(‘3번 집’)으로 바뀌어 있다.
양식이라고 하지만 서울 양옥집 같은 것은 아니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거실 뒷쪽 문을 열면 수세식 화장실이, 오른쪽에 입식 부엌이 있는 정도로서 있을 것은 대략 있게 소규모로 설계된 가옥이다.
두 번 집을 헐고 세 번 집을 지은 내력을 순차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비사’의 줄거리인데 십오 년도 훨씬 넘은 어느 해 모친의 느닷없는 발언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얘야 집이 너무 넓어서 돌아다니기가 힘들다. 너무 낡기도 하다. 작고 편하게 하나 지어야 쓰겄다. 싹 헐어버리고.” 그리고는 한 마디 붙인다. “돈은 많이 필요 없다. 모아 둔 것이 있으니까.”
집을 새로 짓다니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왜냐면 전에 어머니는 돈이 좀 생기면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대주거나 어렵게 사는 친척들을 주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에 쓰는 등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우선 순위였다.
한 칠팔 년 전 내가 신용카드 연체금 낸다고 급전이 필요했을 때 어머니는 어디다 숨겨놓았던 돈인지 상당한 거금 기백만 원을 기꺼이 주신 일도 있다. 당신을 위해서는 구두쇠 같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내 놓는 어머니의 태도에서 우리 아버지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경주최씨 부잣집 딸의 올곧은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