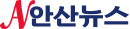어머니는 얼마 전에는 이런 말까지 하셨다. “느그덜은 도시에서 살고 잡겠지만 난 평생 여그서 살다 여그서 묻힐란다. 남들이 새집 짓고 살아도 나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온 이 집이 제일로 좋당개. 느그덜이나 좋은 디서 살거라.”
큰 딸이 있는 인천이나 내가 사는 안산에서 사셔야지 뭣 하러 남사스럽게 시골에서 초라하게 사실라고 그러세요 할 적마다 항상 했던 말인데 최소 대여섯 번은 들었던 것 같다. 우리들이 돈을 좀 모아 아담한 집 한 채 지어드리자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고 불편해도 괜찮다고 고집하셨던 분이다.
그러던 어머니가 갑자기 새집 신축 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깜짝 놀란 내가 “왜 집을 지으려고 그라요”라고 묻자, “하도 넓고 오래 되 불편해서 못쓰겄다 어쩔래 임마”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집에 까끔씩 외지에서 손님도 오고, 니가 서울에서 안산에서 체면치래도 하고 댕길 곳도 많을 텐디 너를 봐서라도 집을 좀 넓혀야 쓰겄다. 그러고 고놈의 눈비만 오면 토방 안까정 빗물이 들친다.”
어머니의 주택 신축 발언에 동생들이나 누님은 그 머릿속을 잘 모르겠다고 했고 그냥 불편하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을 본 즉 주택 신축 발언은 ‘한번 해보는 소리’는 아닌 성 싶었다.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이 집 장남 아닌가. 머리를 굴리고 달리 생각을 해야 했다. 앞 뒤 좌우를 생각하고 행적을 수집하고 추론을 거치자 서서히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속내를. 어머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안 것은 그런 추론과 분석 이후의 일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자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띵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어 울컥하고 콧등이 캥했다.
좀 풀어보면 이런 것이었다. 어머니는 십 수 년 동안 감추고 살았던 속마음을 이제 장성한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이다. 그것은 척추 끝 저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어머니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원초적 욕망이었다.
늦었지만 어머니에게도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체면 유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도시에서 사는 느그덜 봐서라도’ 새집 한 채 지어야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당신 자신의 체면에 맞는 깨끗한 집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큼지막한 텔레비전도 필요하고 한 여름에 시원하게 바람 빵빵 나오는 최신식 엘지 에어컨도 필요하고 예배당에 입고 갈 백옥색 모시 한복과 얄쌍한 구두 신발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또 어머니의 신경에 거슬렸을 법한 이웃 사람들의 동정을 엿보면 이렇다. 서울 아들이 지어준 붉은 벽돌 양옥집 사는 심술궂은 서 씨 마나님, 부잣집으로 시집간 딸이 보낸 여우목도리를 몸빼바지에 두르고 마을 회관에 불쑥불쑥 출몰하는 금태 안경 김 집사,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장롱만한 텔레비전 놓고 최신식 김치냉장고와 싱크대에 물방울 톡톡 튀기며 사는 약방집 강 마사꼬 씨 같은 제법 도시스러운 농민들은 어머니에게는 부러움을 너머 신경이 쓰이는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어머니도 이제 좋은 신발에, 좋은 옷에 분바르고 나타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할매들’을 잠재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의 ‘주택 발언’ 밑에 감추어진 속내이자 욕망일 것이라고 나는 틀림없는 결론을 내려 방망이를 땅땅 쳤고 지금도 그리 확신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