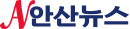‘온 전선이 쥐 죽은 듯 조용하고 평온하던 1918년 10월 어느 날, 우리의 파울 보이머는 전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령부 보고서에는 이날 ‘서부 전선 이상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을 따름이었다.’
이 글은 독일의 레마르크가 자신의 1차 세계대전에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처참함과 삶의 허무를 그린 소설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한 구절이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담임선생의 선동에 현혹된 주인공 파울 보이머와 그의 친구 7명은 참전을 결심한다. 하지만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투입된 전쟁터는 한마디로 지옥 그 자체였다. 군의관은 하루에도 대여섯 명의 다리를 잘랐고, 하루에 스무 명쯤 죽어나가는 병사를 보며, 다른 부상병을 위해 어서 시체를 치우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외로움과 배고픔 속에서 차츰 인간다움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보이머 역시 더 이상 그림과 시를 좋아하던 마음 따뜻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살기 위해 적군을 죽였다. 살찐 들쥐를 심심풀이로 사냥하고, 시체에서 도둑질을 하고, 죽어가는 친구의 장화를 탐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친구들은 하나둘씩 죽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주인공 보이머도 종전이 임박한 어느 날 프랑스 저격수에 의해 허망하게 사망한다. 그런데 그날의 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부 전선의 전체 안목에서 보면 그의 죽음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이상 없다’이다. 역사에는 보이머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고, 오직 그를 포함한 전사자의 숫자로만 기록될 뿐이다. 소설의 문체는 파울 보이머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냉정하게 3인칭으로 바뀐다. 그리고 냉랭하게 말한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고.
저자 레마르크는 전선에서 살아 돌아와 이 소설을 썼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리라. 서부 전선이 왜 이상이 없냐고.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큰 우주 하나하나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안다. 내가 울어도 세상은 같이 울어 주지 않을 것이며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전혀 미동도 않은 채 아무 이상 없다고, 잘 굴러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것임을 말이다.
시인 이상은 그의 詩 ‘최후’에서 이렇게 말한다.
‘능금 한 알이 추락하였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만큼 상했다. 최후, 이미 여하한 정신도 발아하지 아니한다.’
겨우 사과 한 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시인은 지구가 부서질 정도로 상했다고 울부짖는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어떤 정신의 싹도 발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과인가! 그런데 이 정도로 무게를 가진 능금 같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세상은 사과 한 알이 떨어지나 마나, 사람이 사나 죽으나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나의 죽음이 지구에 이 정도 상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시인은 피 끓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말이다.
코로나 정국 속에 2백 명이 넘는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는 제대로 된 애도의 기간도 보내지 못한 채 서둘러 ‘처리’되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들을 하루하루 더해가는 숫자로만 인식할 뿐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즐기지 못하고 보내야 하는 벚꽃과 진달래가 더 아쉬울 뿐이고 바깥나들이 한 번이 더 간절할 뿐이다.
이 와중에 4.16 세월호 6주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코로나 속에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은 오간데 없고, 오히려 총선 정국 속에 선거 전략의 쟁점화를 위한 막말의 소재로 뉴스에 등장하기만 할 뿐이다.
미통당의 막말 후보에게 세월호 희생자 304명과 그들 가족의 고통이 지구를 상하게 하는 사과 한 알의 무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인 이성복의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란 아포리즘처럼 그의 집안 화초의 잎사귀 하나 푸르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라도 지켜달라고, 아니 그것마저 힘들다면 그저 그 입만이라도 제발 다물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뿐이다.
혹시나 올해 우리는 세월호를 단지 304명의 빛바랜 숫자로만 기억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먹먹하기만 하다. 참 잔인한 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