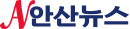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자치가 또 다시 광야에 섰다. 제도적으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0년이 넘었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2013년에 시작했으니 벌써 7년을 넘겼다.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실시중이고 광명, 파주, 인천 등 속속 확대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여전히 시범일 뿐이다.
이유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범이라 함은 연습이라는 의미와 권한이 없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7년을 연습만 하다가 이제 겨우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인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자치의 헌법과 같은 법이다. 법령상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는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근거를 담아 실질적 지원을 명시했다.
그런데 수년간의 준비과정과 자치를 바라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에 올라간 주민자치회 설치조항 제26조가 통째로 삭제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2018년에 겪었던 혁신읍면동 사업의 트라우마가 망령처럼 다시 떠올랐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읍면동 사업은 당시 야당의 반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졌다. 폐기 이유는, 운동권 먹여 살리기 예산이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색깔론이다. 처음에는 꼭 통과시켜 줄 듯 하던 여당도 다른 법안 통과 욕심에 반대하는 시늉, 못이기는 체 하다가 두루뭉술하게 넘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부끄러운 흑역사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주민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5월 29일을 넘기며 상임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고 앞 다투어 나섰다. 최근 언론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청신호가 켜졌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상하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주민자치법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정치인들의 항변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들의 선택은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투사들처럼 외치지만 정작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분권을 하자면서 정작 자신들이 가진 권한은 한줌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제도랍시고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수준이나 인식에 신물이 난다. 주민자치를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듯하다. 주민자치를 뺀 지방자치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신 국민들을 업신여기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과거, 틈만 나면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은 다 어딜 가셨는지, 이렇게 주민자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그 동안 돕겠다고 하셨던 정치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 주실지 궁금하다.
법률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민들의 여망에 대해 당리당략의 결정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민심마저 외면한다.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퇴행해도 되는 것인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있다. 수레의 양쪽 바퀴인 것이다. 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참여민주주의이자 민초들이 만들어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주민이 빠진 자치를 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지 묻고 싶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29조. 주민들은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대접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국민으로서 지방자치법 안에서의 보편적인 주민자치를 하고 싶을 뿐이다. 다소 부족한 역량은 교육과 컨설팅, 벤치마킹으로 강화하면 된다. 지금 상황에 180석 거대 여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 돌려놓기를 정중히 요구한다. 진정한 자치의 바다에서 주민자치를 해보고 싶은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덕분에 통과되느니, 청신호가 켜졌다느니 하는 말잔치는 접으시라. 이 상황이 심히 한심하고 부끄러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