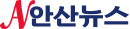생각해보면 대학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당시의 대학도 대체로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바깥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끄러운 이슈들에 반응하고 시위하여 국민에게 현안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라면 그러면서도 고유한 학문과 지성의 아카데미를 향해 쉴새 없이 가고자 했던 것,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캠퍼스는 늘 두 개 이상의 대비되는 광경이 병행되었다. 당국을 향해 저항하는 카오스의 교정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는 탈춤 추고 목련 축제하고 대성리로 MT가는 등 기존 대학질서에 순응하는 코스모스적 교정도 있었다.
학생들은 각각의 장소를 왕래하며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게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도 ‘할 공부’도 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종당에는 상호 보완적 카오스모스라는 목표점을 향해 수렴되고자 했던 것, 이것이 80년대 학생들이 가는 길이었다. 상아의 우골탑은 그런 복수의 교정들을 가감 없이 보여주면서 굴곡지게 그러나 태연하게 시대의 한 복판을 관통해가고 있었다.
당시 대학가 시위는 거의 만성화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노천극장에서 시작하여 전투경찰에 대들다가 인근 청량리 맘모스까지 도망가며 시위에 시위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지치면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루가 가는구나 허기진 정신을 채우기 위해 교정으로 돌아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강당에 가서는 특강을 듣고 도서관에 가서는 하늘과 땅속을 난무하는 그리스 신화를 읽어 상상력을 키웠고 러시아 장편을 읽으면서 영혼을 맑게 씻는 등 ‘할 일’을 해나갔다. 이어령의 흙속에 저바람 속에를 다시 정독하여 한국인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으며 신문 사회면을 가운데 놓고 바깥세상을 토론했다. 그러다가 감수성이 깊어지면 불경과 성서까지 애써 이해하며 신비주의에 젖기도 했다. 기억 희미하지만 모파상의 마틸드를 만난 것도 김유정의 봄봄 속 장인을 뵌 것도 그 무렵이 아니었나 싶다.
또 푼돈을 털어 돌체다방에 들어가 한 손으로는 성냥개비로 석가탑을 쌓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방커피 마시며 솔밭 사이로 흐르는 강물이나 창가에 서면 떠오른다는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들었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그때는 어딜 가나 온통 조용필 판이었다.
솔밭 사이는 ‘새들이 노래하는 이른 봄날’로 시작하여 ‘포도주가 익을 무렵 돌아온다던 그는 죽고 사람들은 무덤가에 야생화를 심었다’로 불리우는 노래, 우리가 학내외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젊은이들의 의식·시각·욕구 등에 양심적 가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미모의 지성 가수 조안 샨도스 바에즈는 반전·평화·저항 등 시대의 메시지를 노랫말에 담아 전 지구를 향해 외치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던 대학 시절의 안식처인 파전집이나 다방에서는 가끔 어른들이나 선배들과도 어울렸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들은 기죽지 않고 반드시 견해를 피력했으며 튀는 발언으로 주위를 끌곤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후배들을 사귀면서 민주주의는 나 못지않게 타인도 중요하다,
현재의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는 미래, 침묵이냐 외침이냐와 같은 화두에 천착하며 점점 어른화 되어갔다. 치기분분하게 보내던 그런 학창의 중반 이후쯤은 늘 막걸리에 불콰했고 가끔씩은 구토였으니 정녕코 젊음의 멋이었으리라.(계속)